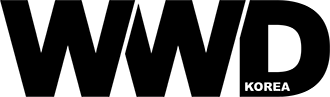미국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지난 2년간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기술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고점에서 S&P500 4.6%, Nasdaq 10%, 엔비디아 27%, 테슬라 25% 하락(9월 6일 기준)하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고점에서 20~25% 하락하면 상승 전환이 어렵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에 크게 상승한 AI 테마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고금리가 2년 이상 지속되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에 발표한 실업률도 샴의 법칙 (Sahm’s Rule)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미국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의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이상이면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1970년대 이후 틀린 적이 없는 지표다. 따라서 경기침체도 막고 물가도 목표 수준 근처까지 하락했으니 이제는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 연준(Fed)이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연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미 유럽연합 (EU), 영국, 캐나다 등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환율 불안정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여기저기서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니 연내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매우 높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가시적인 금융 환경에서 채권 투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이다. 경기가 둔화 (Slowdown) 또는 침체(Recession) 국면에 들어서면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 국면으로의 전환점에서는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 한다.
채권 투자는 거래 단위가 100억 원씩으로 금액이 커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증권회사가 채권을 잘게 쪼개서 개인들이 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채권투자 상품 (펀드, ETF 등)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채권 금리와 투자 손익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만간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전망이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도하면 자본 이익을 볼 수 있고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현 수준의 금리에 채권을 매수해서 장래에 낮은 금리에 채권을 매도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채권 금리는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연 3%대 아래, 은행 예금 금리도 연 3~4%대로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또한 탄탄한 우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도 국고채보다 2~3%의 금리를 더 주는 채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상환 순위가 뒤에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연 5% 정도의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통상 30년 만기로 발행되지만 5년이 지나면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주식과 다르게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순위로 보면 국고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순서로 보면 된다.
요즘 미국 기준금리 (연 5.5%)가 국내 기준금리 (3.5%)보다 높아서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해서 더 높은 금리를 챙기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해외 채권 투자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환율이다. 아무리 높은 금리를 받더라도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이자 수익보다 환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좋은 예가 브라질 국채 투자다. 브라질 국채는 표면 금리가 연 10%를 넘어 한국 국채보다 3배 이상의 이자를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지난 수년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브라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추락하여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대다수다. 10년 전 1헤알당 400원 이상이던 환율은 최근 240원대로 40%나 하락했고 최근 1년 동안에도 약 10% 정도 하락했다. 1년간 받았던 10% 이자도 환율에서 다 까먹은 상황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튀르키예 국채 투자도 마찬가지다. 연 30~40%의 이자를 받지만 환율에서 최근 1년간 20% 또는 5년간 80% 손실을 본다면 불안한 투자다. 투자 대상이 국채이면 그 나라 경제 상황을 잘 검토해야 하고 회사채라면 발행회사의 신용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높은 기대 수익과 비교하면 위험이 높다. 반면에 채권 투자는 기대 수익이 연간 약 5~7% 정도지만 위험은 낮다. 철저하게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의 투자 원칙이 작동한다. 향후 2~3년간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주식과 함께 채권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